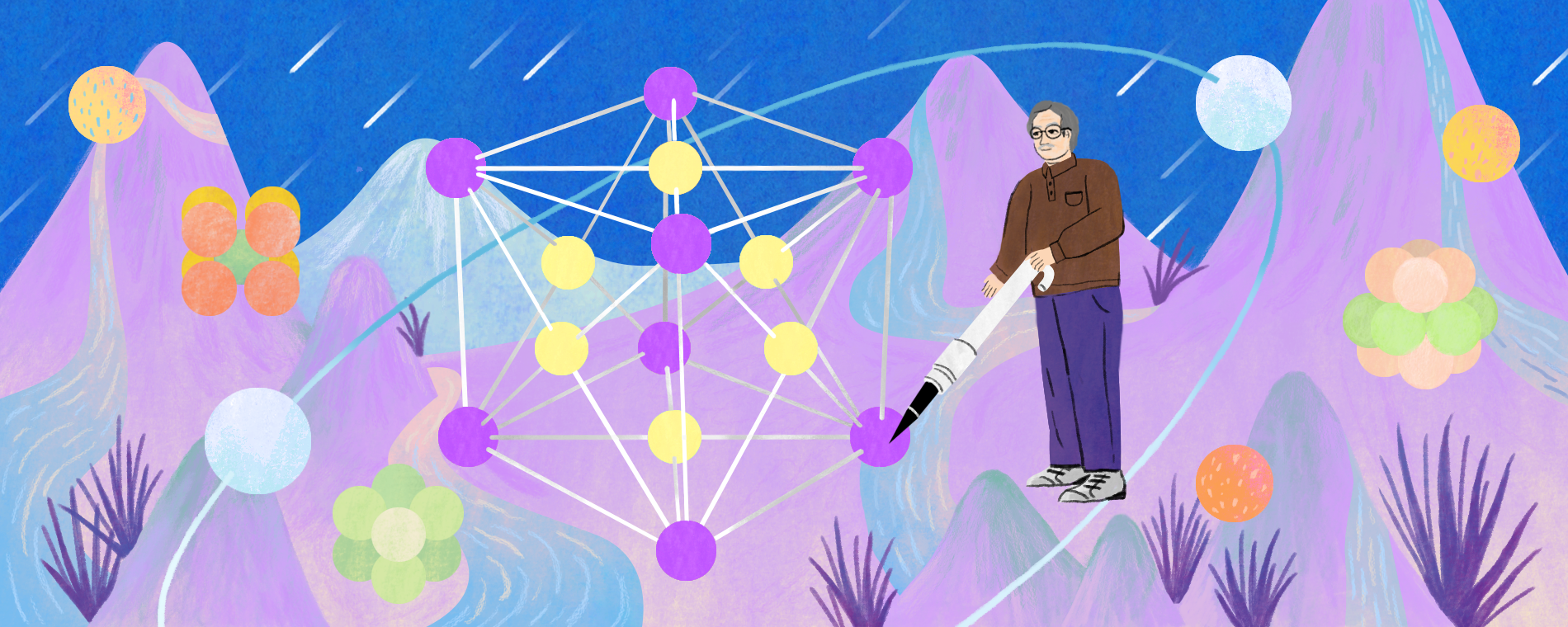들어가며
인류는 주변의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형상을 기록하여 응용하고자 하는 기술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소개되어온 광학 현미경의 발전이 시작되어 사람의 눈만으로는 보기 힘든 작은 물질 구조들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광학 현미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400 nm ~ 700 nm 사이의 전자기파장을 가진 가시광을 이용하여 물체를 확대하여 관측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를 기반으로 대략적으로 이 파장들의 절반 정도의 분해능인 500 nm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하고자 하는 구조가 사용하는 가시광의 파장의 반파장 크기보다 작아지는 경우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광분해능의 한계(회절한계)에 다다르게 된다(그림 1).
이러한 광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기파인 빛을 대신하여 더욱 작은 분해능을 제공해줄 수 있는 물질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24년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드브로이Louis de Broglie가 물질파를 주장함으로써 입자로만 인식하던 전자electron가 빛(전자기파)과 같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클린턴 조지프 데이비슨Clinton Joseph Davisson과 레스터 핼버트 거머 ester Halbert Germer의 고체 결정의 전자산란 실험(데이비슨-거머 실험)을 통해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가시광(전자기파)을 대신하여 전자를 이용하는 현미경이 발명되었다. 1931년 독일의 과학자인 막스 코널Max Knoll과 에니스트 루스카Ernst Ruska가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을 처음으로 발명하였는데 전자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투과시켜 내부 원자 결정 구조들과의 산란scattering 현상을 통해 물질 구조를 측정하는 현미경이다(그림 2). 이후 1938년 에니스트 루스카와 보도 본 보리스Bodo von Borries에 의해 첫번째 상용 투과 전자 현미경이 개발되었다. 투과 전자 현미경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타겟 시료에 전자를 투과시켜 시료의 내부를 측정함으로써 빛의 회절한계를 극복하여 시료의 원자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뛰어난 현미경으로 지금까지도 다양한 고체 물질의 격자 구조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우수한 장비이다. 이렇게 빛을 이용한 현미경의 분해능을 뛰어넘는 원자 스케일 분해능(~10-10 m)을 가진 투과 전자 현미경의 발명으로 다양한 시료들의 원자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공로로 1986년 에니스트 루스카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다만 이 장비로는 시료의 표면 형상surface topography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후 1937년 본 아르데네Manfred Von Ardenne는 시료의 표면을 전자로 측정할 수 있는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발명하였다(그림 2).
앞서 언급된 주사 전자 현미경의 경우 기존 광학 현미경에서 사용되는 빛(전자기파) 대신 전자를 적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시료의 표면이 전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전도성이 있어야 하며, 전도성이 없는 시료의 경우는 표면에 금속을 얇게 코팅 해야 한다. 이는 시료 표면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의 표면에 추가적인 공정을 하는 것으로 초기 표면 특성을 온전히 측정할 수 없으며, 시료에 원치 않는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명된 현미경이 원자힘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이다.
원자힘 현미경의 발명 및 원리: 주사 터널 현미경 발명
전자 현미경의 경우 전자 빔으로부터 전자가 나와 시료까지 퍼져 나가 반사되는 신호를 받는 것으로 원자 수준까지 작은 표면 측정을 위해서는 전자빔의 세기를 키워야 한다. 이러한 전자의 적용 범위를 줄이면서 원하는 부분에서만 전자의 작용을 확인하는 방식이 발명되었는데 이것이 주사 터널 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이다. 이 장치는 1981년 IBM의 게르트 비니흐Gerd Binnig와 하인리히 로러Heinrich Rohrer가 발명하였고(그림 3), 그 공로로 1986년 앞서 언급한 에니스트 루스카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주사 터널 현미경의 작동 원리
주사 터널 현미경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끝부분에 원자가 하나만 남을 정도의 뾰족한 전도성 탐침(일반적으로 금으로 만드나, 텅스텐이나 백금, 이리듐 등으로도 만든다)과 전도성 시료에 전압을 걸어주고 시료 표면에 탐침을 접근시킨다. 처음에는 탐침과 시료 표면사이의 진공 벽을 전자가 통과하지 못하나 원자수준의 거리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면 양자 터널quantum tunneling 효과로 탐침과 시료 표면사이의 진공 벽을 통과하여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그림 3). 시료 표면의 원자 단위 분해능을 줄 정도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탐침과 시료 표면사이 거리를 압전piezoelectric소재로 구성된 z-축 scanner로 조절을 한다.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간 고정 거리에 비례하는 전류를 계속 유지하도록 피드백 신호를 z-축 scanner에 보내어 탐침과 표면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과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과정을 각지점마다 얻으면서 역시 압전소재로 제작된 x, y-축 scanner로 시료를 움직인다. 이렇게 시료의 각 지점마다 적용하는 피드백 신호가 시료의 높이 변화 값이며 이를 각 위치마다 기록하며 이미지화 하면 원자 단위의 표면 이미지로 지형을 형상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극저온, 진공상태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시료 표면의 원자 스케일 지형 및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하는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원자힘 현미경 발명
탐침을 이용한 주사 터널 현미경의 경우 전자의 양자 터널 효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용되는 탐침도 전도성이 있어야 하며 시료도 전도성 물질 혹은 반도체 물질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과 같이 시료 표면에 금속을 코팅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으나, 이미 언급된 것과 같이 이경우 시료의 초기 상태를 측정할 수 없고 금속 코팅과정 중 시료가 손상되는 등의 단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관측하고자 하는 시료를 손상 없이 그 본연의 상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명된 현미경이 원자힘 현미경이다(그림 4).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표면에 추가적인 금속막을 코팅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비전도성 탐침 끝의 원자와 시료 표면 원자 간의 인력과 척력을 측정함으로써 표면 지형 이미지topography image을 얻을 수 있는 원자힘 현미경은 1985년 주사 탐침 현미경을 발명한 게르트 비니흐와 캘빈 퀘이트Calvin Quate 그리고 크리스토프 거버Christoph Gerber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이후 켈빈 퀘이트 교수의 제자인 박상일 박사에 의해 첫번째 상용 주사 탐침 현미경이 개발되었다.
원자힘 현미경의 작동 원리
원자힘 현미경은 앞서 소개된 주사 터널 현미경의 작동원리를 적용하여 발명된 현미경이다. 다만 주사 터널 현미경이 탐침과 시료 표면간의 거리 측정을 전압을 걸어 전류가 양자터널 효과로 흐르는 방식을 이용한다면, 원자힘 현미경은 탐침 끝의 원자와 시료 표면의 원자들 간의 거리에 따라 작용되는 척력과 반 데르 발스van der Waals 인력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그림 5). 시료 표면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탐침 끝의 원자와 시료 표면의 원자간 힘은 처음에 약한 원자간 인력이 시작되어 각 원자의 전자 구름들의 정전기적 안정점까지 급격히 증가한다. 이렇게 인력이 커지는 탐침과 시료 표면의 거리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경우를 비접촉 모드Non-contact Mode라 부른다. 반면 탐침을 더욱 시료 표면에 가까이하게 되면 인력이 줄어 들다가 사라지고 척력이 생기는 지점, 즉 힘이 사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때가 두 원자가 만나는 화학적 본딩 거리이다. 이 지점을 고정해서 측정하는 경우를 접촉 모드Contact Mode라 부른다.
원자힘 현미경의 탐침은 시료 표면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탐침과 시료 표면 원자 간의 힘을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캔틸레버 끝부분에 탐침이 있는 구조를 사용한다. 이 탐침이 부착된 캔틸레버가 탐침과 시료 표면의 원자간 인력 혹은 척력에 의해 상∙하로 휘어지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캔틸레버의 상∙하 휘어짐은 탐침이 부착된 반대편의 높은 반사도 표면에 외부에서 주사하는 측정용 레이저를 반사하여 측정한다. 즉 반사된 레이저를 상∙하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광 측정 다이오드Position-Sensitive PhotoDiode, PSPD에 입사시켜 캔틸레버의 상∙하 휘어짐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그림 6).
탐침이 시료에 접근하기전 초기 캔틸레버 상태의 반사된 레이저 입사 위치를 광 측정 다이오드 중앙에 맞춘다. 이후 탐침을 시료에 가까이 접근시키면 탐침과 시료 표면간의 원자힘에 의해 캔틸레버가 약간 위로 휘게 되고 이로 인해 광 측정 다이오드 중앙에 맞춰 있던 레이저 포지션이 위로 올라간다. 초기에 설정된 탐침과 시료 표면간의 접촉 힘을 보여주는 레이저 이동이 측정되면 탐침이 시료에 다가가는 과정을 멈추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압전소재로 제작된 x, y-축 스캔을 진행한다. 이 과정 중 시료 표면의 높이가 변화되면 역시 압전소재로 제작된 z-축 scanner를 상∙하로 조정하여 변화된 레이저 위치를 초기 접촉된 위치로 되돌리는 피드백 루프를 진행한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시료와 탐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때 시료의 높이 차이만큼 이동된 레이저 위치변화 크기를 기존의 표준 시료와 켈리브레이션한 수치로 환산하여 시료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식을 바로 적용하는 방법이 접촉 모드(그림 6)이다. 이러한 접촉모드는 탐침 끝이 물리적으로 시료 표면에 접촉한 상황에서 스캔을 하므로 아무리 주의를 해서 스캔을 해도 탐침과 시료 모두 측정하면서 손상이 되는 것을 완벽히 피할 수 없다. 반면 탐침과 시료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식이 비접촉 모드인데, 이 경우 우선 캔틸레버에 특정 주파수로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시료에 z-축 방향으로 다가간다. 이 과정 중 탐침 끝의 원자와 시료 표면 원자 사이의 인력이 있는 지점에 다가가면 걸어주는 주파수 진폭과 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된 지점에서 탐침의 z-축 방향 이동을 멈추고 그 변화된 주파수를 유지하면 탐침과 시료가 접촉 없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x, y-축으로 이미지 스캔을 진행하는 방식이 비접촉 모드이다(그림 7).
즉, 원자힘 현미경은, 이렇게 접촉 혹은 비접촉 모드 방식으로 탐침이 시료에 접근한 이후 x, y-축 scanner로 스캔을 하면서 시료 표면의 높이 변화가 생기면 상∙하로 휘어지는 캔틸레버에 반사된 레이져 변화를 광 측정 다이오드로 실시간 측정하여 초기 레이저 위치로 가도록 z-축의 압전소자 scanner를 상∙하로 움직이는 피드백 루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시료 표면의 각 위치마다 피드백 루프로 얻은 높이 정보를 2차원으로 형상화하면 시료의 원자 스케일 지형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맺음말
본 연재물에서는 원자힘 현미경 탄생의 역사적인 내용부터 간단한 작동 원리까지 살펴보았다. 원자힘 현미경이 개발된 이후 시료 표면을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의 원자력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기능을 가진 탐침을 적용하면 이로부터 시료의 표면 형상과 함께 다양한 표면 특성(전기적, 자기적, 열적 특성 등)을 역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 연재물에서는 원자힘 현미경을 기반으로 시료의 표면 형상과 함께 다양한 표면 특성을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주사형 탐침 현미경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First tunneling electron microscope, Germany, 1938 | Deutsches Museum in Munich
[2] G. Binnig, H. Rohrer, C. Gerber, E. Weibel, Phys. Rev. Lett. 49, 57 (1982)
[3] G. Binnig, C.F. Quate, C. Gerber, Phys. Rev. Lett. 56, 930 (1986)
[4] First atomic force microscope, United States, 1985 | Science Museum Group Collection
[5] Park Systems Corporation. Image 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