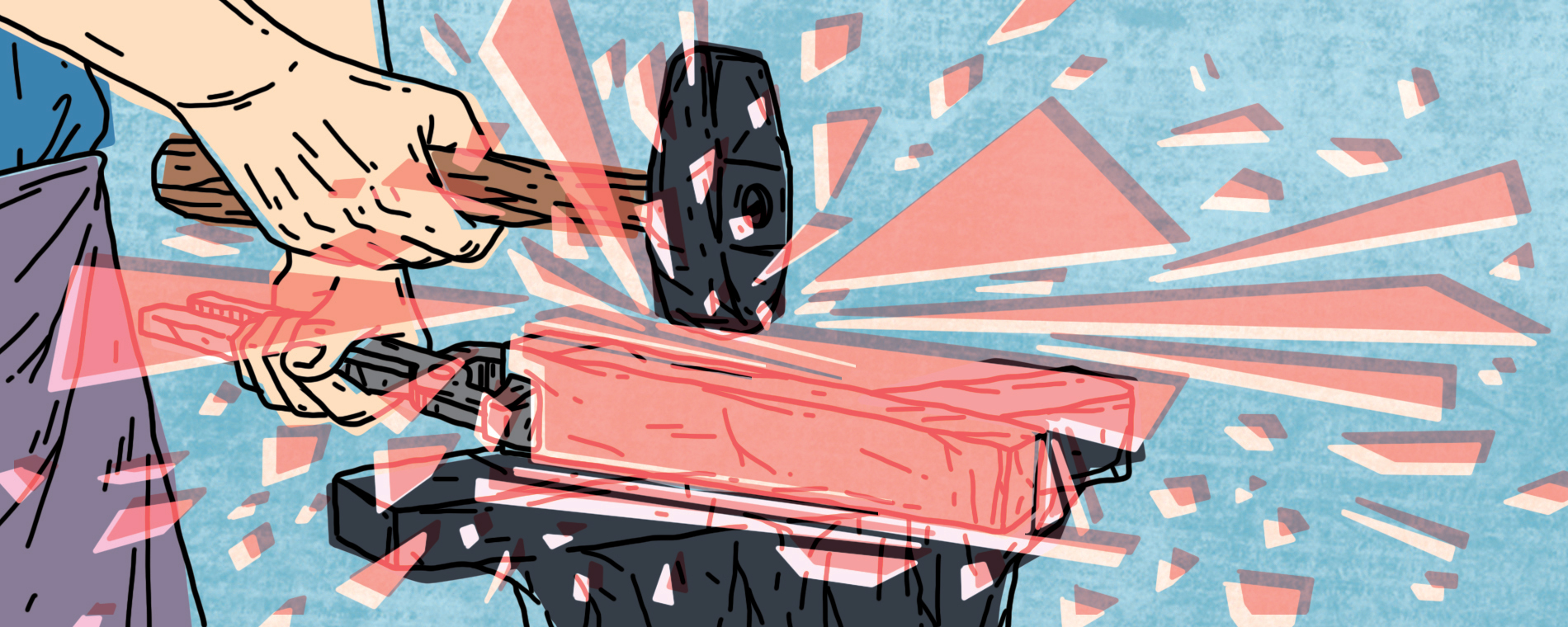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물리학은 “물질과 시공간에서 물질의 운동, 그리고 물질과 관련된 에너지나 힘 등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 필자에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개만 고르라면 “물질matter”과 “시공간spacetime”을 꼽을 것이다. 에너지나 힘은 물질을 이해하는 방법의 일종이다. 사실 “시공간”이 상대론적 개념이므로 흔히 사용하는 개념인 “시간time”과 “공간space”으로 분리하고 나면, 물리학은 간단히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에 실재하는 거의 모든 것이 물리학자들의 학문적 탐구 대상이라는 것이다.
20세기 초중반에 발전하기 시작한 고체물리학은 고체 상태인 물질의 성질과 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선사시대 이래로 인류가 고체물질을 사용한 역사가 수만 년 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야 물성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에 기인한다. 하나는 일찍이 고대인들이 털가죽으로 문지른 호박amber이나 마그네시아 지방의 자철석에서 보았던 잡아당기는 힘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고체 물성은 그 내부의 전자electron들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20세기 이전에 뉴턴역학으로 이들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작은 고체물질 조각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들과 이들을 잡아주는 원자핵의 개수가 아보가드로의 수(6×1023)만큼 많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20세기 초반에 발달한 엑스선결정학을 통해 대부분의 고체물질 내부에서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고체물질의 내부를 설명하는데 수학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발달한 양자역학이 전자의 특이한 물성을 설명하면서 고체물리학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현대물리학의 일부인 고체물리학은 인간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발전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처럼 인류사를 시간순으로 크게 나누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및 철기 시대로 구분된다. 이런 구분은 인간이 주로 어떤 고체 재료를 이용해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여 왔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들을 거치며 인간이 사용한 각각의 고체물질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를 결정해왔을 뿐 아니라, 물질을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도 보여준다.
위의 시대 구분은 원래 19세기 초 네덜란드의 고고학자 위르겐센 톰슨Juergensen Thomsen이 제안한 “세 시대 체계Three-age System”에 기인한다. 톰슨은 여러 고고학 유물이 제작된 연대를 찾아내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들이 돌, 청동 및 철이라는 점을 찾아냈다. 이후 19세기 중반 영국의 은행가이자 과학자인 존 루복John Lubbock은 돌로 만들어진 유물에서 ‘미개’와 ‘문명’의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구석기Paleolithic와 신석기Neolithic의 구분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세 시대” 또는 “네 시대” 체계는 문자적 역사가 존재하기 이전인 선사시대를 대상으로 제안된 것이나, 철기의 사용이 역사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종료 시점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혹자는 우리가 아직도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제 본론에서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네 시대” 체계를 하나씩 따라가며 각 시대의 이름을 결정한 물질의 고체물리학적 의미를 알아보고, 해당 물질들이 역사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자 한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및 철기 시대 중에서 물질 활용을 위한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가장 크게 발전한 시기는 언제일까. 아래의 글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구석기 시대 2백60만 년 전 ~ 기원전 10,000년경
구석기 시대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도구 제작과 사용을 시작한 시기로, 주로 흑요석 등의 돌을 깨뜨려 만든 날카로운 화살촉 모양이나 무른 돌을 굴려서 둥글게 만든 형태 등의 도구가 전해진다. 그런데 동물 중에도 까치나 원숭이처럼 나뭇가지나 돌로 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도구를 사용하기만 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라 말할 수 없다.
흔히 “도구의 인간”이라고 잘못 번역되는 “Homo Faber”는 “만드는 인간” 또는 “인간은 만든다”라는 뜻이며, 이렇게 도구를 직접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구분된다. 구석기 시대의 도구들은 식량 등의 물건을 자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사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날카롭고 둥근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구석기 시대의 돌로 만들어진 도구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관찰한 모양을 모방하여 원하는 형태로 좀 더 가공한 것이다. 이러한 구석기 도구들을 만드는 데에는 힘과 에너지가 사용되었으며, 이 역시 여러 동물들이 자신들의 주변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물리량과 같다.
물론 구석기 시대는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인간의 창의성을 암시하는 시대였다. 3만 년 전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 담긴 프랑스 쇼베 동굴 벽화도 구석기 사람들이 자연을 관찰해 옮겨 그린 것이다. 최근 독일과 슬로베니아에서는 약 4만 년 전 새 다리뼈에 구멍을 뚫어 만든 피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석기 당시 인간은 이미 다양한 물질을 이용해 창의적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이 시기의 유물이 대부분 돌로 만들어진 이유는 돌이 가장 흔하고 가장 오래 남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신석기 시대 기원전 15,000 – 기원전 2,000년경
원래 “세 시대 체계”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의 연장선 상에 있다. 그러나 “네 시대 체계”의 구분 중에서 신석기는 유일하게 “혁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리는 시대이기도 하다. 흔히 인류의 식량 확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시기라는 점을 들어 “농업 혁명”이라는 말을 널리 사용하나, 그 시대의 변화 전체를 “신석기 혁명”이라 통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농경의 시작 이외에도 사회와 계급의 구성, 언어의 발전과 예술의 시작, 종교의 출현 등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인간이 동물과 뚜렷이 구분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이후의 역사에서 신석기 혁명에 버금가는 규모의 변화는 산업혁명 시기에나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마치 물질 사용의 측면에서 보면 네 시대 중에 신석기 시대가 가장 변변치 않은 변화의 시대인 것처럼 보인다. ‘신석기’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유물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칼이며, 이들은 용도에 따라 구멍이 뚫린 반달 모양이거나 양날을 가진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짧은 돌을 거칠게 깨뜨려 사용하던 구석기 돌칼에 비해 신석기 돌칼은 상당히 발전된 제작 기술을 보여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을 보다 더 잘하게 된 것을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에는 다른 사회문화 측면과 달리 물질의 사용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 시대의 ‘신석新石’, 즉 ‘새로운 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자.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래 “신석기 시대新石器時代, The Neolithic Age”라는 말은 ‘석기 시대 중에서 후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돌로 만든 석기를 쓰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중요한 ‘새로운 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깨달음을 준다.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새로운 돌’은 바로 흙으로 만든 토기다. 토기는 돌이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해 잘게 부서진 결과물인 흙을 물과 섞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든 후, 섭씨 약 600 – 800 도에서 가열하여 단단한 돌과 같은 상태로 되돌린 것이다. 그러므로 토기의 구성 원소를 살펴보면 지표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규소Si와 산소O를 주성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소량의 알루미늄Al, 철Fe, 칼슘Ca, 마그네슘Mg 등을 포함하여 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토기를 만드는 과정은 인간의 손 외에도 열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섭씨 800도 내외의 온도는 흙을 녹일 정도로 높지 않으나 흙 알갱이의 표면에서 원자가 증발하듯이 떨어져 나와 가까운 거리에 놓인 다른 흙 알갱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에너지를 공급한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는 열에너지를 활용한 원자 수준의 물질 가공이 최초로 시작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토기의 제작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형태의 물건을 인간의 필요와 지혜에 의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물과 곡식을 함께 토기에 담아 익혀서 먹는 신석기 시대의 조리방식은 인류의 신체 변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동기 시대 기원전 3,300년경 – 기원전 2세기
청동이란 구리Cu, copper에 주석Sn, tin을 약 12% 정도 섞은 합금을 의미한다. 청동기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약 2천 년 정도의 ‘동기 시대copper age’가 있었다고 알려지며,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식수를 공급하는 구리관이 발견되었다고도 한다. 신석기 시대에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높은 온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노하우가 점차 쌓여갔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온도를 섭씨 1,085도까지 높이면 구리가 녹기 시작한다. 녹아서 액체가 된 구리는 비교적 손쉽게 원하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으나, 식어서 고체가 된 이후에도 그다지 단단하지 않아서 석기를 대신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약 2천 년간 누적된 인류의 경험을 통해,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녹은 구리에 소량의 주석을 섞으면 훨씬 더 단단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는 원자 수준의 혼합을 통해 고체물질의 물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깨닫고 활용하기 시작한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열에너지를 사용한 점은 단지 신석기 시대의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동기 물질 활용의 혁명적 변화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바로 섭씨 약 1천도 이상에서 금속이 액체가 되는 현상을 이용해 거푸집으로 같은 물건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토기를 만들면서 회전판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생산 기술이 발달했으나, 결국 하나씩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반면, 액체 상태인 금속을 활용하면서 거푸집을 사용해 같은 모양을 갖는 도구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청동기 시대의 인류는 이러한 대량생산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였을까? 물론 일부 농업생산을 증대하고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도 사용했으나, 전해지는 유물을 보면 도끼, 화살촉, 창, 단검 등에 더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 시대는 아프리카 북부의 고대 이집트 왕조, 지중해의 고대 그리스 미케네 문명, 중국의 상商과 주周나라 등 거대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된 시기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동기로 대량 생산된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청동기가 농기구를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청동이 돌 만큼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구리와 주석이 비교적 귀한 금속이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배운 바에 따라 지표면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원소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O-Si-Al-Fe-Ca-Na-K-Mg-…와 같은데, 보다시피 구리와 주석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동은 지배층과 권력자가 사용하는 물질이었던 셈이고, 전쟁은 지배층에게 중요한 업무였다. 지배층에 중요한 또 다른 업무는 하늘에 올리는 제사와 피지배층과의 신분 구분을 위한 몸의 치장이었는데, 이에 쓰이는 여러 물건도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철기 시대 기원전 1,200년 경 이후
청동기 시대보다 철기 시대가 오늘날과 시간상으로 훨씬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가보면 철로 된 유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철기 시대에도 귀한 물건은 여전히 철이 아닌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한 O-Si-Al-Fe-Ca-Na-K-Mg-…중 철Fe은 알루미늄에 이어 네 번째로 흔한 원소다. 따라서 철기 시대는 금속 사용의 대중화를 연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많은 알루미늄은 상당수가 돌과 흙 안에 존재하는데, 섭씨 660도의 낮은 온도에서 쉽게 녹지만 산소 등의 음이온과 결합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인류가 이를 금속 형태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은 19세기에서야 가능해졌다. 철로 만든 고대 유물이 드문 또 하나의 이유는 철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산소나 물과 결합해 녹슬어 부서지기 때문이다. 녹이 슬지 않는 철을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발전하였다.
철은 섭씨 1,538도에서 녹는데, 청동기 시대를 거쳐 약 3천 년 동안 발달한 금속 제련기술을 통해 광물에서 철을 녹여내는데 충분한 열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식혀서 굳어진 철은 청동보다 약간 가벼우나 훨씬 단단하다. 따라서 거친 땅을 일구는 농기구를 만드는데 적합할 뿐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철기를 이용해 칼을 만들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는데, 청동기 칼처럼 거푸집을 이용해 철 칼을 만들면 쉽게 부러졌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칼이 부러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 이미 수천 년간 청동으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철로 만든 무기는 쉽게 청동 무기를 대체하지 못하였다. 철로 만든 칼이 청동 무기보다 우수한 성질을 갖게 된 것은 결국 새로운 기술 혁신에 의해서였다.
우선 구리와 철 내부의 원자 배열을 비교해보자. 구리는 탁구공을 가지런히 쌓은 것처럼 원자들이 모여 서로 삼각형을 이루고, 그 위에 또 다른 원자가 놓이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책상 위에 탁구공을 가장 빽빽하게 밀집시킨 형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자 배열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한 층을 이루는 원자들이 옆으로 한 칸씩 밀리는 방식으로 쉽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한 층의 원자들이 옆으로 밀린 후에도 전체적인 원자의 배열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구리의 부드러운 성질은 바로 이러한 배열 형태에 기인한다.
구리 원자에 반지름이 약 7% 정도 더 큰 주석 원자가 섞여 있으면 옆으로 밀리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에, 청동은 구리보다 좀 더 단단하다. 철의 경우에는 (양자역학적인 원인에 의해) 원자들이 빽빽하게 밀집된 배열을 싫어하며, 따라서 서로 약간의 공간을 두고 벌어져 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원자층이 옆으로 한 칸 밀리기 위해선 더 멀리 움직여야 한다. 철의 단단한 성질은 바로 이런 원자 배열 때문이다. 철은 단단한 만큼 상대적으로 더 잘 부러지며, 철 원자 사이로 탄소 원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단단하고 잘 부러지게 된다.
좋은 칼은 단단한 동시에 유연해야 하며, 결국 강해야 한다. ‘단단함’이 눌리거나 찍히지 않고 견디는 성질인 데 비해 ‘강함’은 부러지지 않고 잘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연함’은 어느 정도 휘어졌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질이며, 쉽게 변형되는 ‘부드러움’과 다르다. 철이 이렇게 복합적인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의 원자 배열을 구리와 비슷하면서도 적절하게 뭉치고 흐트러진 형태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철을 섭씨 약 1,000도로 가열하면 원자 배열이 구리와 비슷하게 변하면서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가열된 철 덩어리를 망치로 내려쳐 내부 원자 배열을 적절하게 바꾸는 동시에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대장장이질blacksmithing’이다. 또한, 구리와 비슷해진 원자 배열을 열이 식은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뜨거운 철을 찬물로 급하게 식히는 방법도 쓰인다. 이와 같이 철기 시대는 바로 대장장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철기 무기는 신석기 시대 이래로 사용해온 단순한 열에너지의 이용을 뛰어넘어, 인간의 기계적 작업과 끈기를 결합해 얻어진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철기 시대 초기 대장장이질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었으며, 따라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청동 무기와 달리 잘 만들어진 철 칼은 귀한 물건이었다.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철 칼은 “검은 불”의 이미지와 합쳐져서 신화의 일부가 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기 시대에는 특별한 칼과 관련된 영웅 신화들이 등장하는데, 아더왕이 돌에 박힌 엑스칼리버를 뽑아내는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혼신을 다해 만든 철기 칼은 전투에서 부러진 후에도 그 영적인 힘을 유지한다고 여겨졌다. 주몽이 숨겨놓은 부러진 칼 조각을 찾은 아들 유리가 고구려로 가서 왕위를 계승하는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북유럽에도 예언이 담긴 부러진 칼로 새 칼을 만들어 용을 죽인 뒤 영웅이 되는 지크프리트의 신화가 있다. 20세기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파다완padawan이 제다이 기사Jedi knight가 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의 광선검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도 철기 시대 전통을 본뜬 것이다. 이러한 대장장이질이 철기 시대의 보편적인 기술이 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는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등의 거대 제국이 등장하고 중국에서도 진시황이 최초로 중원을 통일하였다.
나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 문화는 어떤 고체물질로 규정할 수 있을까? 우선 현대사회는 어느 한 가지 물질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물질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철기 시대를 거치며 발달한 고온 열처리 기술을 통해 여러 금속이 원소 별로 분리되었으며, 18세기 안톤 라부아지에 등에 의해 기체를 이루는 원소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제는 인간이 화학주기율표periodic table of chemical elements 상에 등장하는 모든 원소를 순수한 형태로 활용하거나, 또는 원하는 만큼 섞고 결합해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현대는 원자보다 더 작은 전자를 사용하는 “양자물질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초기에 귀하던 대장장이질이 결국 철기 시대의 보편적인 기술이 된 것처럼, 20세기 초중반에 시작한 고체물리학도 이제는 대학에서 널리 가르치는 학문이 되었다. “네 시대”에 이루어진 원자 배열에 대한 이해와 이용은 이미 공학의 범주가 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고체물리학자들은 전자의 특이한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양자물리학에 집중하고 있다. 고체물리학에서는 화학주기율표에 나열된 100여 개의 원소를 이해하기 위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단 세 가지만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 가지 중, 우리가 인식하는 대부분의 물질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질량이 가장 가벼운 전자로, 양자물질은 이러한 전자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양자물질이며, 그 밖에 자성체, 유전체, 초전도체 등도 이미 널리 사용되는 양자물질이다.
그런데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반도체인 규소가 석기 시대에 널리 쓰였던 돌이나 흙의 주성분에서 산소를 떼어내고 남은 원소라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또한 반도체 소자의 초기 아이디어를 제공한 진공관도 규소와 산소가 주성분인 유리로 만든다.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한다. 수백 년 후에 인간의 물질 활용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지, 규소는 또 어떻게 활용될지 자못 궁금하다.